3.2K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자인 의사결정을 처음 시도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기대를 갖곤 합니다. “데이터만 보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바로 알 수 있겠지?” “이 안에 정답이 있겠지?”
데이터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질문 말이죠.
예를 들어 디자이너가 ‘페이지별 이탈률’ 데이터를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다른 페이지의 이탈률은 평균 10%~30%인데 특정 페이지만 이탈률이 약 80%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답을 찾는 UX/UI 디자이너 또는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이 페이지에는 이탈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레이아웃, 컬러, 폰트, 버튼 크기, 문구 등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말 데이터는 ‘이 페이지에는 이탈을 유발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정답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데이터는 질문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 사용자들은 이 페이지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을까?
● 그들이 찾으려 했던 정보는 무엇이었을까?
● 그들은 이전 페이지에서 무엇을 보고 이 페이지로 왔을까?
● 그들은 왜 하필 이 구간에서 떠나기로 결정했을까?
● 그들은 떠난 뒤 다시 왔을까? 아님 다시는 오지 않았을까?
이 질문들을 잘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모든 질문의 주어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화면 디자인이나 특정한 기능보다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을 먼저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UX 디자인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기 버튼 클릭률이 왜 낮지?’가 아니라 ‘사용자는 이 버튼을왜 누르지 않았지?’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어에 기능 대신 사용자를 두면 자연스럽게 사용자를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질문의 범위는 화면을 넘어 훨씬 넓은 지점까지 확장됩니다.
● 사용자는 왜 많은 커머스 가운데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까?
● 사용자는 왜 헤어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선택한 걸까?
● 사용자는 왜 반려동물을 키우기 시작한 걸까?
● 사용자는 왜 갤럭시가 아니라 아이폰을 고집하는 걸까?
왜 이렇게 사용자의 행동을 궁금해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데이터만 보고 디자인을 수정하면 임시방편에 그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와 맥락을 이해하면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제 페이지의 이탈률을 개선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문제를 찾기 위해 화면이나 특정 기능만을 본다면 ‘결제 버튼을 못찾아서 이탈했다’와 같은 답을 찾기 쉽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수정하겠죠. 그러나 사람을 향해 질문한다면 ‘결제 전 배송비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찾지 못해서 이탈했다’와 같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제 전에 배송비 정보를 잘 보이게 배치하여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UX 디자인에서 사용자 피드백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문 조사, 리뷰, 고객 응대 자료, 유저 인터뷰 등에서 사용자의 목소리를 찾곤 하죠.
하지만 모든 사용자 피드백이 유용하거나 의미 있는 통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사용자 피드백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서비스 품질이 낮아지거나 이도 저도 아닌 제품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최악의 경우엔 사용자 목소리만 믿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았는데 그들의 말과 다르게 시장에서 외면받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사용자의 목소리를 왜 그대로 믿으면 안 될까요?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서비스는 하나여도 이용하는 사람은 다양하며 각각 조금씩 다른 이유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모든 사용자가 똑같은 니즈와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각 사용자의 경험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피드백이 서로 충돌하거나 상반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용자는 기능을 더 단순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반면 다른 사용자는 기능을 더 추가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어떤 사용자는 ‘재생 목록 추천 기능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고 하는 반면 다른 사용자는 ‘더 다양한 맞춤 추천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서로 상반된 요구사항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런 모순적인 피드백을 무작정 반영하면 제품의 핵심 방향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요구사항이나 불만사항은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 때 말합니다. 또는 이용하는 데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내 의사를 전달하기 귀찮아서라도 그냥 이용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너무 마음에 안 들 경우 의사 전달을 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에 비해 기능의 세부사항에 더욱 민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세세하게 말할수록 우리는 그 기능이 정말 문제처럼 인식되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서비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큰 목소리로 애정을 드러내는 사용자 역시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하나의 목소리가 너무 달콤해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은 ‘모두 이 사용자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목소리든 고객의 소리는 대부분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사용자들이 냅니다. 그들이 모든 사용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님에도 소수의 니즈를 다수의 니즈로 착각하여 이들의 의견을 전부 수용하면 정작 조용히 잘 이용하던 다수의 사용자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서비스를 넓은 시야로 볼 수 없고 관련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불편하다’는 느낌은 받지만 정확히 어떤 점이 문제인지는 말하기 쉽지 않죠.
이럴 때 사용자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버튼이 작다’라는 의견의 진짜 문제는 크기보다는 그들이 버튼 위치를 인지하지 못한 데 있는 것처럼요.
아마도 사용자는 이용하면서 ‘글쓰기 버튼이 어디 있는 거야. 아, 여기 있네. 아니 버튼 크기를 이렇게 작게 해 놓으니까 눈에 안 띄지’라고 생각한 뒤 “글쓰기 버튼이 작아서 찾기 어렵습니다”라는 피드백을 적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의 본질은 위치이기 때문에 버튼의 크기를 키워도 “글쓰기 버튼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꿔주세요”와 같은 제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에서 봤던 기능을 요구하거나 과거에 경험해봤던 기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들은 정보 안에서만 문제를 찾고 해결 방법을 떠올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용자는 익숙한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혁신적인 해결책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직 먹어보지 못한 음식의 맛을 상상하기 어렵듯이 사람들은 기존의 관습을 벗어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위 글은 『데이터 삽질 끝에 UX가 보였다』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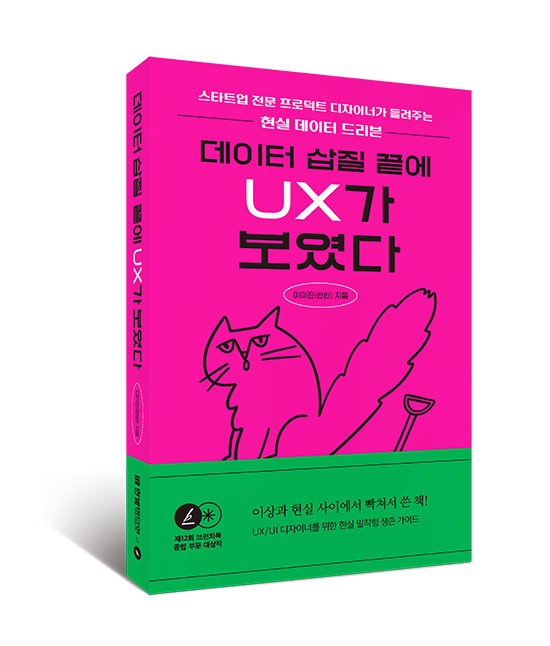
댓글